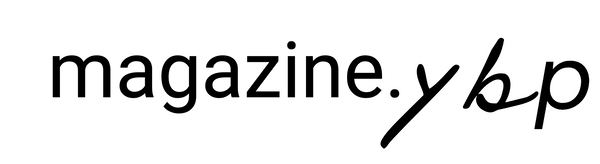#22 달과 500원
Share
By @nwangerd 황남규

뉴욕에서의 일화: 9 to 5 & 5 to 9
우리 ybp 단골 등장인물인 릴 티제이와 뉴욕 여행 동안 했던 대화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가 하나 있다. “여기 사람들은 너가 9 to 5에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오히려 5 to 9에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 오!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떠돌던 생각을 이렇게 명쾌하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래서 사람은 자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하나보다. 마치 ybp의 기사 레이아웃과 티셔츠를 작업할 때도 자꾸 레퍼런스 작품들을 봐야했던 것 처럼 말이다.
이번 뉴욕 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내 소개를 할 때 사이드 프로젝트로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들 관심을 가졌고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도 계셨다. 그리고 실제로 테크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디테일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다고 한다. 하하.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떨까? 이 곳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종종하지만 확실히 그 빈도는 적은 것 같다. 심지어는 가끔씩 매거진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 자체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매거진 덕에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화 종결, goodbye, the end까지 급행열차를 타버리는 것이다.
나 포함 한국어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 - 좁게 보면 한국, 넓게 보면 아시아 - 에서 9 to 5에 무얼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 특히 우리가 ybp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형태로든 일을 통해 수입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서 더더욱 그렇다. 우리 나이 때는 소개팅을 주선할 때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는 하지 않던가. “xx 회사 다니는 yy살. 키는 zzz. 받을래?” 왜 우리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9 to 5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뉴욕이 옳고 아시아는 틀린걸까? 이러면 내 맘속의 흥선대원군이 곤란해한다. 질문을 바꿔보겠다. 9 to 5가 그럼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9 to 5에 ‘무엇’을 하는지가 정말 궁금한걸까? 우리가 9 to 5말고 따로 할 이야기가 있을까? 아마 외모 정도. (젠장)
나는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완전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고 내가 일은 대충하고 남는 시간에 잡지만 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 뭐라고 나를 표현해야 하는걸까. ybp는 일과 삶 두 영역에서 모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3인방이 모여서 운영하는 매거진이다. 이번 기사에서 이런 내 생각에 대해 좀 더 적어보겠다.
달과 6펜스
최근 작가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 라는 소설을 읽었다. 달과 6펜스는 광기에 가까운 예술적 영감과 충동에 휩싸인 한 남자 – 스트릭랜드 – 의 삶에 대한 관찰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스트릭랜드는 작중에서 ‘6펜스(영국 동전)’로 대표되는 문명 사회의 물질과 질서 그리고 관습을 전면으로 거부한다. 대신 그는 ‘달’로 대표되는 이상향, 문명을 초월하는 가치 – 여기서는 예술이다 – 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의 말마따나 그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종의 절대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을 한순간에 내팽개친 채 오직 예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스트릭랜드의 엄격하리만큼 강한 이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로 하여금 천재로 인정받는 작품을 완성하게끔 한다. 그 과정속에서 주변 인물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고, 또 융화되기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든 큰 영향을 받게된다. 정작 스트릭랜드는 삶 내내 타인과의 인간적 교류를 철저하게 거부하지만 말이다.
이 작품은 스트릭랜드라는 가상의 인물의 삶을 매개채로(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인간이 집착하는 물질과 관습에 대해 비판하고, 삶에 작용하는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러한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전에 몇가지 생각해볼만한 포인트가 있다.
1. 스트릭랜드는 작중에서 철저한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혐오로 똘똘 뭉친 인물이지만 – 한마디로 싸가지가 바가지다 - 자의와 상관 없이 주변 인물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 심지어 그 책을 읽는 독자마저 말이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2. 스트릭랜드의 매력과는 별개로, ‘달’만을 추구하는 스트릭랜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어딘가 모르게 내게 거부감을 일으켰다. 그러면 나는 작고 빛바랜 ‘6펜스’에 파묻힌 사람일까.
3. 작중 달빛과 동전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걸까? 생각해보면 500원짜리 동전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을 때 보다 달빛 밑에 있을 때 더 빛을 내지 않는가.
순수한 열정
스트릭랜드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예술에 대한 천재성에만 있지는 않을것이다. 나는 그림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원초적이면서 강력한 열정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예술로 표현되는 그의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지만, 무언가에 열정 있는 사람은 개중에서도 빛이 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열정에 끌리며 그에 감화된다.
스트릭랜드가 예술을 하느라 직장을 내팽개친 것과는 다르게 나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믿는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보상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끌린다. 무슨 일을 하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매력을 느낀다. 스트릭랜드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두 영역 - 달과 동전, 또는 삶과 일 - 을 관통할 수 있는 공통점은 순수한 열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일과 삶 두 영역에서 모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함과 동시에, 퇴근 후에는 잡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다. 출장을 준비하며 동시에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벽 어스름 속 풀내음을 맡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종류로 정의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하는 잡지로만 표현되고 싶지 않다. ‘xx회사 다니는 yy살 남자’로 대표되기도 싫으며, 동시에 이를 혐오하여 철저하게 배제했던 스트릭랜드도 되지 않겠다. 오히려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그와 동시에 일 외에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9 to 5와 5 to 9을 모두 열심히 채우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싶다. 나는 달빛과 그 밑에서 빛나는 500원,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광경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