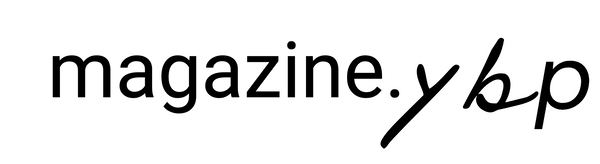#3 싱가포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Share
Editor: 박지현 @_j_ihn.b
싱가포르에 오기 전 내가 생각하는 싱가포르의 직장인의 삶이란, 아사이볼로 간단히 아침을 채우고 sweetgreen 에서 Guacamole greens 샐러드를 사들고 퇴근하는 삶이었다. 저렇게만 먹으면 굶어죽을 텐데. 흔히 뉴요커 = 베이글이란 공식이 싱가포르에도 소급 적용되어 생긴 로망이 아닐까. 어떤 경험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저런 그리너리한 삶을 꿈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의 나는 다르다.
이제 곧 싱가포르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한국과 싱가포르를 분기마다 오고 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며 충동적으로 떠난 여행들을 합치면 작년 한 해 14번 정도 여행을 갔다. 이런 삶이 어느 부분 만족스럽기도 했지만 뭐든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건 변치 않는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싱가포르에서의 삶을 다시 채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테니스, 재즈피아노, 도자기 클래스 등 알차게 채울만한 것들은 많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주기적인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미뤄왔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생각이나 고민이 많고 여행에 지쳐 쉬고싶을 때, 밥을 해먹었다. 한국에 있었다면 당장 배민을 켰겠지만 싱가포르는 다르다. 싱가포르가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 나의 집밥 일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말할 수 있다.
싱가포르식(食)
싱가포르식(食)은 집밥, 레스토랑, 호커 센터, 배달로 나뉜다. 레스토랑, 호커 센터, 배달을 놔두고 왜 집밥을 해먹게 되었는지 내가 느낀 싱가포르 식문화를 공유하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Hawker center
위 4가지 선택지 중, 가장 싱가포르스러운 건 Hawker center (호커센터) 가 아닐까. 호커 센터는 간단하게 말하면 싱가포르식 푸드코트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대부분 호커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데, HDB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아파트단지에는 호커센터가 1개 이상은 있을 정도다. 이를 다 합치면 약 120개 정도라고 한다. 그 중 유명한 건 사테거리로 유명한 라오파삿 (Lau Pa Sat)과 영화 [Crazy Rich Asians]에 나온 Newton Food Center이다.
*HDB : Housing & Development Board 싱가포르의 공공 아파트
*Lau Pa Sat (Satay Street)
호커 센터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식 꼬치구이인 Satay, 찐 가자미에 삼발 소스를 얹은 Stingray, 무를 넣어만든 떡과 여러 야채를 넣은 일종의 오믈렛과 전 그 사이에 있는 이름과는 다른 요리 Carrot Cake, 싱가포르식 칼국수 Ban Mien, 여러 해물과 에그 라이스누들을 섞어 볶은 Hokkien Mee, 여행 오면 꼭 먹는 칠리크랩과 치킨라이스까지. 다양한 북경, 광둥, 페라나칸, 동아시아까지 여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이곳과 친해지지 않은 이유는 물티슈를 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사실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기름지고 밀가루 그 본연의 맛이 난다. 그것이 아주 종종 싱가포르의 정서를 느끼러 땀을 뻘뻘 흘리며 타이거를 들이키고 싶은 날을 제외하면 주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이유인 것 같다.
*호커센터 테이블에 붙어있는 안내문
“ Clear your table to avoid a fine”
레스토랑
싱가포르의 외식물가도 만만치 않다. 둘이서 괜찮은 레스토랑에 간다고 하면 9%의 GST, 10%의 Tax까지 내고나면 보통 19%를 더 내야 한다. 더군다나 술이 비싸니, 싱가포르에서 주말 동안 브런치와 저녁약속을 가는 것보단 차라리 주변 여행을 하는 게 더 괜찮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선 “그 돈이면 발리 가지” 라는 “그돈발” 밈이 있다.
배달
배달 음식의 퀄리티 또한 가격대비 그저 그렇다. 한번은 배달 초밥을 통해 연어에서도 비릿내가 날 수 있음을 느낀 뒤, 집에서 해먹을 수 없는 도넛, 치킨, 피자를 제외하면 거의 시켜먹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환경적/나의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 덕분에 난 아주 따뜻한 집밥을 자주 해먹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싱가포르에는 의외로 샐러드나 건강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집밥 일기엔 주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사명이 담긴 요리가 많이 있다.
집밥 일기 (5가지 요리)
1. 당근계란김밥
김밥은 정말 아름다운 요리다. 누가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물었을 때, 난 1위는 샤브샤브로 이야기했었고, 한국식 샤브샤브와 월남쌈은 제외해야 한다는 조건을 듣고 나서야 김밥을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골랐다. 그 정도로 김밥을 좋아한다.
나의 목표와 의도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데, 다이어트와 건강식이라는 목표는 3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다. 그 목표에 아주 잘 맞는 건강식이 바로 당근 계란 김밥이다. 이 김밥에는 무려 계란이 3개나 들어간다. 당근을 채 썰어 후추를 가득 넣어 같이 넣은 기름이 주황색이 될 때까지 잘 볶아준다. 당근의 vitamin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볶아야 영양소 흡수가 높다. 그걸 핑계로 올리브오일을 아주 듬-뿍 넣고 볶아주면 된다. 그러고는 계란 세 개를 풀어 동글동글 탱탱하게 말아준다. 당연하게도 김 / 밥과 함께 말아주면 바로 당근.계란.김밥이다.
2. 망고 가득 요거트
싱가포르에서 단연 최고의 복지는 망고다. 이전엔 올리브영산 건망고만 먹었다면, 이젠 생망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나에겐 작은 행복이었다. 여기는 요거트도 맛없어?라고 불평하던 찰라에 그래도 꽤 꾸덕하고 달달한 요거트를 찾았다.(*farmers union greek style yogurt) 거기에 방금 자른 망고를 가득 올려 먹으면, 내가 찾을 수 없었던 아사이볼 로망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요리 같았다.
3. 메밀온면
싱가포르는 거의 매일 비가 오는데, 특히나 오전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날이 개지 않고 하루 종일 흐리다. 그런 날에는 뭔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메밀 온면이 이 비 오는 날의 쿰쿰함을 채워주는 음식이다. 나의 맛있는 메밀 온면은 맛있는 메밀면과 코인 육수만 있으면 완성이다. 야채는 취향껏.
라면 끓일 정도의 물에 코인 육수를 넣고, 팔팔 끓어오르면 손질한 야채랑 메밀면을 그래도 넣고 마지막에 휘휘 저은 계란 하나를 풀어주면 완성이다. 여기서 잠깐, 욕심내서 계란을 두 개 넣었다면 그냥 안 먹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으니 단백질 보충은 다른 음식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 너무 간단하게 따뜻한 한 끼를 해먹을 수 있는 메밀온면. 이건 마치 원팬 파스타처럼 원팬온면이라 이름 붙이고 싶다.
4. 야채 가득 카레
자취생 or 집밥생(?)의 간단 요리 대명사는 김치찌개 그리고 대망의 카레이다. 이 두 음식의 공통점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이 깊어진다는 점. 하지만 외국에 사는 우리에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기란 쉽지 않은 미션이다. 일단 맛있는 김치가 없을뿐더러 나도 모르게 김치를 아끼게되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김치찌개가 부대찌개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카레가 더 접근성 있는 집밥이라는 설명을 이렇게나 길게 했다.
카레안에 야채를 함께 넣어 끓여 뭉근하게 익은 야채보다는, 따로 구워 카레위에 올려먹는 야채카레를 좋아한다. 카레는 양파를 잘게 다져 볶다가 고체 카레 두 블록과 물을 넣고 끓였다. 올라간 야채는 미니 가지, 감자, 단호박, 토마토, 파프리카, 연두 빛깔의 고추이다. (연두 빛깔 고추는 찾아보니 당조고추라고 한다.) 야채는 소금-후추-올리브오일을 뿌려 오븐에 구웠다. 이번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이 야채 카레를 해먹어 보는 걸 추천한다. 한 그릇 만들어내면 반나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5. 오이 땅콩 김밥
마지막 요리는 또 김밥이다. 이번엔 단백질은 없지만 불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오이 땅콩 김밥’이다. 먼저 준비물은 오이, 김, 밥, 취향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땅콩 가루가 전부다. 이건 불을 쓰지 않는 만큼 조금의 준비과정이 더 필요한데, 오이를 먼저 절여둬야 한다. 오이 2개 정도를 얇게 썬 뒤 소금 한 T 스푼을 넣고 살짝 절여둔다. 오이가 말랑말랑해지고 물이 빠져나온다면 이제 짠기를 머금은 오이를 한두번 더 헹궈주고 물기를 빼주면 된다. 단순하게 말하면 오이지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참기름 아주 조금의 소금을 더하면 속 재료는 완성이다. 여기에 김+밥+만들어둔 오이지를 합치면, 그게 오이 김밥이다. 그대로만 먹어도 아주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지만 조금 더 고소함을 더하려면 땅콩 가루를 얹어주면 된다. 땅콩가루가 없었다면 땅콩버터를 올려먹었겠다 싶을만큼 괜찮은 조합이니 한번쯤은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여기에 후식까지 얹어주면 아주 완벽한 한끼가 완성된다.
해외에 살다보면 다들 이런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조금 낯선 공간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는건 스스로의 뿌리를 단단히 붙들고 가야하는 일이니, 더더욱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채우는 방식은 음식이라, 이번 기사는 나의 아주 사소한 집밥일기로 시작했지만 자기자신을 채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방법들을 이 매거진을 통해 담고싶은 마음으로 기사를 마무리 한다.